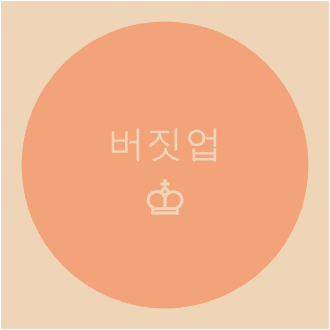-
중국 최신 반도체 기술의 현황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어떤 수준인가? 칩 설계 능력, 공정 기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CPU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중국 회사로는 자오신이 있다. 자오신은 VIA라는 대만의 CPU 회사가 2013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상하이시와 합작회사를 세울 때, 그 대가로 VIA의 기술 라이선스를 넘겨받았다. 최근 자오신은 이 기술의 연장선에 있는 카이샷이라는 CPU를 TSMC의 16나노 공정에 위탁 생산하여 출시하였다. 이 칩의 스펙은 최고 클록 3.0기가헤르츠, 8코어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능은 평범한 인텔의 내장 그래픽 칩만도 못하다. 동일 세대 인텔의 x86 칩과 비교해봐도 자오신 칩은 대략 1/3 이하의 성능이다. 동일 클록 수로 비교하면 AMD의 두세 세대 이전 CPU와 유사한 성능이다. 그런데 단위 작업당 소모되는 전력은 훨씬 높아서 동일 세대의 CPU 대비 대략 3배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결국 소모 전력까지 고려한 성능은 현세대 CPU의 대략 1/9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것은 공정의 문제에 앞서 칩의 설계 기술이 선진업체 대비 적어도 1~2세대 이상 뒤져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 속도는 무섭다. C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과점하고 있는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역시 무서운 기세로 따라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NAND 플래시메모리 양산 업체인 국유기업 YMTC 등에 2025년까지 1조 위안을 투자하여 삼성전자의 주력 아이템 중 하나인 DRAM 사업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 특히 최신 DRAM 메모리의 용량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 된 3D 적층 구조 구현에서도 YMTC는 2019년 64단, 128단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화웨이를 필두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CPU 설계 업체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급성장에 힘입어 자사의 AP 칩 기린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했다. 2020년 1분기만 해도 하이실리콘은 중국 스마트폰용 AP 시장에서 44퍼센트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였다. 하이 실리콘이 또 한 가지 손을 뻗고 있는 사업은 서버용 반도체 분야이다. 서버는 애초에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적 처리가 관건이므로 CPU가 아주 필요하다. 이 역시 하이실리콘의 서버용 CPU 쿤펑이 담당하였다. 5G 무선통신 분야에서도 하이실리콘은 마룽이라는 통신 칩세트를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다. 화웨이가 차세대 IT 영역까지 비즈니스를 넓혀간다 해도 어쨌든 각 기기에서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아마도 설계는 모두 하이실리콘에서 맡길 것이다.미국의 기술 제재로 중국 반도체 대응 전략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맞부닥친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생산이다. 이제 TSMC는 물론이고 해외의 다른 파운드리 회사들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생산 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중국에는 SMIC라는 세계 5위 파운드리 업체가 있지만 SMIC만으로는 요구되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 SMIC에 생산을 위탁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술 수준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SMIC의 양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차세대 패터닝 설비 확장과 미래 기술 선진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것이 확실하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생산 반도체의 비중을 70퍼센트로 올리겠다고 목표를 천명한 바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15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SMIC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향후 3년간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급률 70퍼센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계획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SMIC의 설비 확충과 더불어 한국 와 대만의 반도체 기술 인력들에 대한 스카우트 시도도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SMIC가 2022년 7월에 발표한 7나노 공정에 활용된 DUV 멀티패터닝 기술은 칩을 분해해 본 결과 2014년에 TSMC가 개발한 공정 기반의 SoC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 실제 SoC 칩의 성능과 소비 전력 데이터 전송 속도 등도 TSMC가 제조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미 TSMC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있기 한참 전인 2003년과 2009년에도 SMUC를 제소하고 승소한 바 있기도 하다. SMIC가 발표한 7나노 공정 기술 역시 동일한 스펙과 구조로 추정컨대 TSMC로부터 유출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SMIC는 7나노 공정에서 활용된 DUV 멀티패터닝 전략에서도 볼 수 있듯 EUV 없이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의 수율 강화 및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업계의 선두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제재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1위 파운드리 SMIC뿐만 아니라 2위 화 홍 그룹, 3위 넥스 칩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규모를 확대하려 하는데 이는 동일 기간 기준 대만의 19개와 미국의 12개 라인 증설 계획을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 기술 세대에서 뒤처지는 것을 라인 규모 확대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기술 제재가 느슨해질 경우 중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은 뒤처진 기술 로드맵을 줄이기 위해 신규 장비 도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거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일본 반도체 왕국 시대와 시련 (0) 2023.05.13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와 차세대 기술 확보 전략 (0) 2023.05.11 반도체 환경 신뢰성 시험과 온도에 대한 변화 (1) 2023.05.09 반도체 패키지 신뢰성과 수명 평가 항목 (0) 2023.05.07 반도체 패키지의 간략한 역사와 진화 과정 (0) 2023.05.05
버짓업의 반도체 이야기
안녕하세요. 반도체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